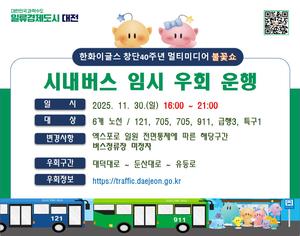|
| 최주환 (전)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
알렉산더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다. 그에게는 난폭하지만 멋진 말이 있었다. 이름이 ‘부케팔로스’였다. 이 말은 등에 그 누구도 타지 못하게 했다. 부케팔로스가 날뛰면 어떤 조련사도 이 말을 다루지 못했다. 그런데 모두가 조련을 포기할 즈음에 알렉산더는 부케팔로스가 자기 그림자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부케팔로스가 날뛰면 그림자도 덩달아 날뛰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동안에는 난폭한 부케팔로스를 진정시킬 수 없었다. 알렉산더는 부케팔로스에게 다가가서 얼굴을 해 쪽으로 향하게 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도 미친 듯이 날뛰던 부케팔로스가 차분해졌다. 이후로 알렉산더와 명마가 된 부케팔로스는 평생 동반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 신화 같은 이야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하나는 두려움의 실체이고 다른 하나는 알렉산더의 통찰력이다.
부케팔로스가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자신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다. 그림자는 본체의 움직임을 따를 뿐이다. 다른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일본의 어떤 소설가는 그림자에도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풀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데도 그림자를 두려워하면 그림자가 이상한 추동력을 발휘하게 된다. 자신의 가치실현과 역할수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다. 어떤 이미지가 덧씌워진 막연한 느낌일 때가 많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두려움도 실체와 역동이 있다기보다는 불행한 경험과 이미지가 합성된 결과인 경우가 많다. 물론 물리적 폭력이 만들어내는 두려움마저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호소하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자신이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알렉산더가 부케팔로스의 얼굴을 해 쪽으로 돌려서 그림자를 보지 못하게 한 통찰력은 놀랍다. 물론 오랜 관찰이 통찰력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알렉산더에게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몇 개 더 있다. 그 중 하나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다. 알렉산더가 왕이 되어 동방원정 길에 나섰다가 프리기아라는 나라에 들렀다. 프리기아에는 나무껍질로 만든 매듭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레가 있었다.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고르디우스의 예언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매듭을 풀어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해법은 달랐다. 매듭이 있는 수레로 다가가서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렸다. 부케팔로스의 얼굴을 돌려세운 것이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린 것은 해답이 가까이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알렉산더와 부케팔로스의 이야기에서 ‘두려움과 통찰력’을 함께 생각한 이유가 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는 점과 그 두려움이나 난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라고 사전은 말한다. 두렵다고 생각하는 양상의 대부분은 염려나 불안이 키워낸 것들이다. 이 염려나 불안을 방치하면 ‘부케팔로스의 그림자’가 된다. 부케팔로스의 그림자가 된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려면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림자를 보던 시선을 해 쪽으로 돌려야만 해결할 수 있다.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이번 한 주간도 여러 난제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문제의 포로가 되면 우중충하고 자신감 없는 한 주간이 될 뿐이다. 시선과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그래야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
손정임 기자 sjo5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