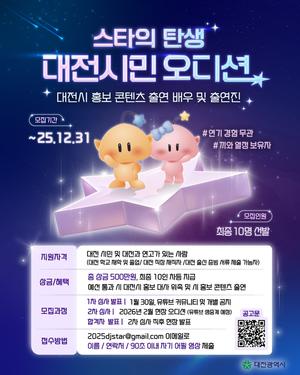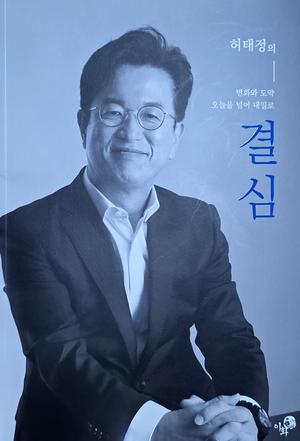여덟 명의 가난한 청소년들이 살아낸 10년의 이야기를 보았다. 대견한 아이도 있었고, 답답한 아이도 있었다. 어쩌다가 벗어나기 어려운 가난의 올가미에 붙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지경에 빠졌는지,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
 |
| 최주환 (전)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
청소년의 가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고, 의지와 상관없이 빠진 수렁이다. 여덟 명의 청소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을 몸에 달고 살았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아예 닫혀 있다.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는 말이다.
이런 숨 막히고 좌절이 널린 세상을 ‘견뎌낸 것’만으로도 우선 대단했다.
굳이 책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가난은 비극이다. 부부관계가 어그러지고 가족이 흩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목숨이 앞당겨지기도 한다.
청빈한 삶을 예찬하는 소리를 듣는데, 허튼 소리일 뿐이다. 끼니를 걱정하고 돈의 부족을 여러 사람 앞에서 경험해 본 사람이면 가난은 모자람이고 부끄러움이고 아픔일 뿐이다. 쉽사리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슬프기까지 하다. 어렵게 가난을 벗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례는 매우 드물다.
가난의 최대비극은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어울릴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관계의 아픔’도 크다. 다 눈물 나는 일들이다.
나도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 시절의 꿈은, 쌀밥을 원 없이 먹어보는 것이었다. 쌀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보리가 절반 넘게 섞이고, 고구마나 무채를 올린 밥이 자주 상에 올랐다.
지금이야 일부러 해먹는 별식이 되었지만, 그때는 정말이지 입에 대기도 싫었다. 푸념도 할 수 없어서 밥을 억지로 우겨넣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보리밥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간혹 생각날 때가 있긴 하지만, 돈 내고 사먹으러 가지는 않는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아버지의 헌신 덕분에 지독한 가난을 뿌리칠 수 있었다. 그 시절, 교회와 동네에서 한 가족처럼 보낸 ‘너나 없는 돌봄과 나눔의 일상’도 큰 힘이 되었다.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인도출신 하버드대 교수는 ‘가난은 단순히 재화의 부족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의 박탈’이라고 했다. 효율적인 생산과 이윤의 추구가 불평등과 빈곤을 양산한다고도 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주거가 보장되는 사회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에 읽은 책,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는 이 부분을 주목하게 한다.
등장인물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다시 생각했다. 강지나 작가의 지극한 마음을 만난 독서였다.
손정임 기자 sjo5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