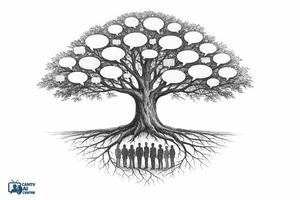|
| 최주환 (전)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
지인들과의 학습모임에서 질문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했다. 질문이야말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지름길임을 절감했다. 실제로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기보다는 손들고 질문하면 학습효과가 여러 배 높아진다. 특히 숨넘어갈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무턱대고 끌려 다니지 않으려면, 의문이 생길 때마다 질문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질문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다. 지시와 순응만이 존재할 뿐이다. 질문이 없으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오가지 않는다. 질문이 없으니 다양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 열심히 받아 적기는 하는데 깨달음이 동반되지 않는다. 질문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질문은 이해의 틀을 교정하고 확대한다. 생각을 모으고 행동을 모으는 기폭제가 된다. 질문은 새 세계를 연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간혹 엉뚱한 질문 때문에 분위기가 급랭되는 경우가 있다. 앞뒤 맥락을 끊는 질문이 그렇다.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질문이라고 둘러대는 것도 비슷한 일이다. 푸념을 질문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질문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말을 늘어놓는다고 질문이 되는 건 아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할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전후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조금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먼저 질문해 보라는 말이다. 이 질문이 타당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자신의 질문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질문의 의지를 꺾는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질문을 위한 질문이거나 주제와 상관없는 물음까지 다 질문이라고 여길 수는 없다.
가장 고약한 질문이 있다. 자신의 의사나 주장을 확인하고 싶어서 내놓는 질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동조자를 구하려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질문의 외피를 두르고 동의나 동조를 강요하는 경향이 많다. 정책토론회에 가면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다. 주제가 특정되어 있고, 그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주제와 반대편에 있는 주장을 펴면서 질문이라고 우기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현직에 있을 때, 국회에서 복지재정 확대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복지현장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끈질기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억지주장을 쏟아내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현명한 질문이라고 강변했다. 이건 질문이 아니다. 질문은 제언이나 건설적인 비판이어야 한다. 주장이 되면 안 된다.
학습현장의 질문과 회의석상에서 하는 질문을 혼동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학습현장에서는 모르거나 애매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질문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묻는 일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회의석상에서 ‘몰라서 묻는다’고 시작하는 질문은 바른 질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회의 자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묻는 것은 시간낭비요, 회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면박을 줄 일은 아니지만, 질문도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래도 질문이 말라가는 현상은 닫힌 세계로 들어가는 불길한 징조다. 질문이 많아야 곁길로 새는 일이 줄어든다. 질문은 권장되어야 하고, 질문을 망설이거나 귀찮아하는 풍토도 개선되어야 한다. 질문은 우리 삶의 내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건강한 질문들이 오가는 세상, 함께 만들면 좋겠다.
조명호 기자 cambroadcast@naver.com